비즈
전 세계가 'K-콘텐츠'에 열광하는데…정작 韓 미디어는 왜 '위기'인가?
2025-09-09 16:3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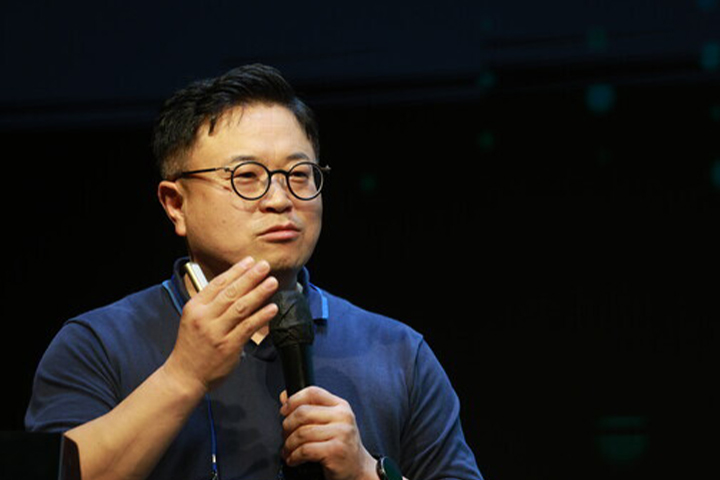 전 세계가 '오징어게임'과 '피지컬 100'에 열광하고, '재벌집 막내아들'이 해외에서 리메이크되는 K-콘텐츠의 황금시대. 그러나 이 화려한 축제의 이면에서 정작 K-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한국 미디어 기업들은 '광고 수익'이라는 낡은 마차에 기댄 채 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섬뜩한 경고가 나왔다. 이제는 광고판을 빌려주는 '부동산 임대업' 수준의 수익 모델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청자를 상대로 직접 '장사'에 나서는 '커머스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절박한 진단이다.
전 세계가 '오징어게임'과 '피지컬 100'에 열광하고, '재벌집 막내아들'이 해외에서 리메이크되는 K-콘텐츠의 황금시대. 그러나 이 화려한 축제의 이면에서 정작 K-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한국 미디어 기업들은 '광고 수익'이라는 낡은 마차에 기댄 채 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섬뜩한 경고가 나왔다. 이제는 광고판을 빌려주는 '부동산 임대업' 수준의 수익 모델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청자를 상대로 직접 '장사'에 나서는 '커머스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절박한 진단이다.지난 4일, 미디어오늘이 주최한 '미디어의 미래 컨퍼런스'에서 김기주 한국리서치 기획사업본부장은 한국 미디어 산업이 마주한 위기의 본질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유튜브 등 글로벌 OTT와의 전쟁이 격화되는 지금, 더 이상 대한민국만을 시장으로 보는 시대는 끝났다. 시청자(오디언스)를 중심에 놓고 수익 모델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
K-콘텐츠의 위상은 이미 세계적이다. 넷플릭스 내 한국어 오리지널 콘텐츠 비중은 불과 2년 만에 3배 이상 폭증했고(2020년 2% → 2022년 6.8%), 시청 시간 기준으로는 무려 13%를 차지한다. 이는 미국, 영국에 이어 전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압도적인 영향력이다. 드라마뿐 아니라 예능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며, 이는 세종학당과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 사무소 확대로 이어지며 '한류'라는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막강한 '콘텐츠 파워'를 가졌음에도, 국내 미디어 기업들의 수익 구조는 여전히 광고주에게 목을 매는 전근대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김 본부장은 "한국 미디어는 광고 공간을 비워놓고 임대하는 구조"라고 꼬집으며, 이제는 미디어 기업이 직접 '광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 해법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미디어 커머스'의 강화다. '오징어게임' 시즌이 공개될 때마다 쏟아지는 협업 상품들, '흑백요리사' 출연 셰프들이 편의점과 손잡고 내놓은 도시락 제품이 그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이는 콘텐츠의 IP(지식재산권)와 팬덤을 활용해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한 단계 진화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미디어 기업이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오피니언 리더와 시청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어, 직접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하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변화는 플랫폼 활용 방식에서도 시급하다. Z세대의 43%가 유튜브 '쇼츠'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시대에, 여전히 유튜브 채널조차 없거나 심지어 자체 앱도 갖추지 못한 언론사가 있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라고 김 본부장은 지적했다. 이는 급변하는 미디어 소비 트렌드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우물 안 개구리' 신세를 자인하는 셈이다.
결국 K-콘텐츠의 미래는 '어떤 콘텐츠를 만드느냐'를 넘어, '그 콘텐츠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달려있다. 광고주가 아닌 시청자의 지갑을 열게 할 매력적인 상품을 기획하고, 쇼츠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에 맞는 콘텐츠를 유통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미디어는 K-콘텐츠의 화려한 성공을 구경만 하다가 결국 도태될 것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BEST 머니이슈
- 31살에 29억 벌고 먼저 은퇴해, 비법없고 규칙만 지켰다!
- 37억 자산가, 여름휴가 전 "이종목" 매수해라!! 한달
- 4개월 만에 35억벌었다!! 주식, 순매도 1위종목..."충격"
- 72억 기부한 미녀 스님, 정체 알고보니..충격!
- 로또1등 "이렇게" 하면 꼭 당첨된다!...
- 월수익 3000만원 가능하다!? 고수입 올리는 이 "자격증"에 몰리는 이유 알고보니…
- 인삼10배, 마늘300배 '이것'먹자마자 "그곳" 땅땅해져..헉!
- 일자리가 급급하다면? 月3000만원 수익 가능한 이 "자격증" 주목받고 있어..
- 공복혈당 300넘는 '심각당뇨환자', '이것'먹자마자
- [화제] 천하장사 이만기의 관절튼튼 "호관원" 100%당첨 혜택 난리나!!
- "한국로또 뚫렸다" 이번주 1등번호.."7,15…"
- "부동산 대란" 서울 신축 아파트가 "3억?"
- 이만기의 관절튼튼 "호관원" 100%당첨 혜택 난리나!!
- 남性 "크기, 길이" 10분이면 모든게 커져..화제!























